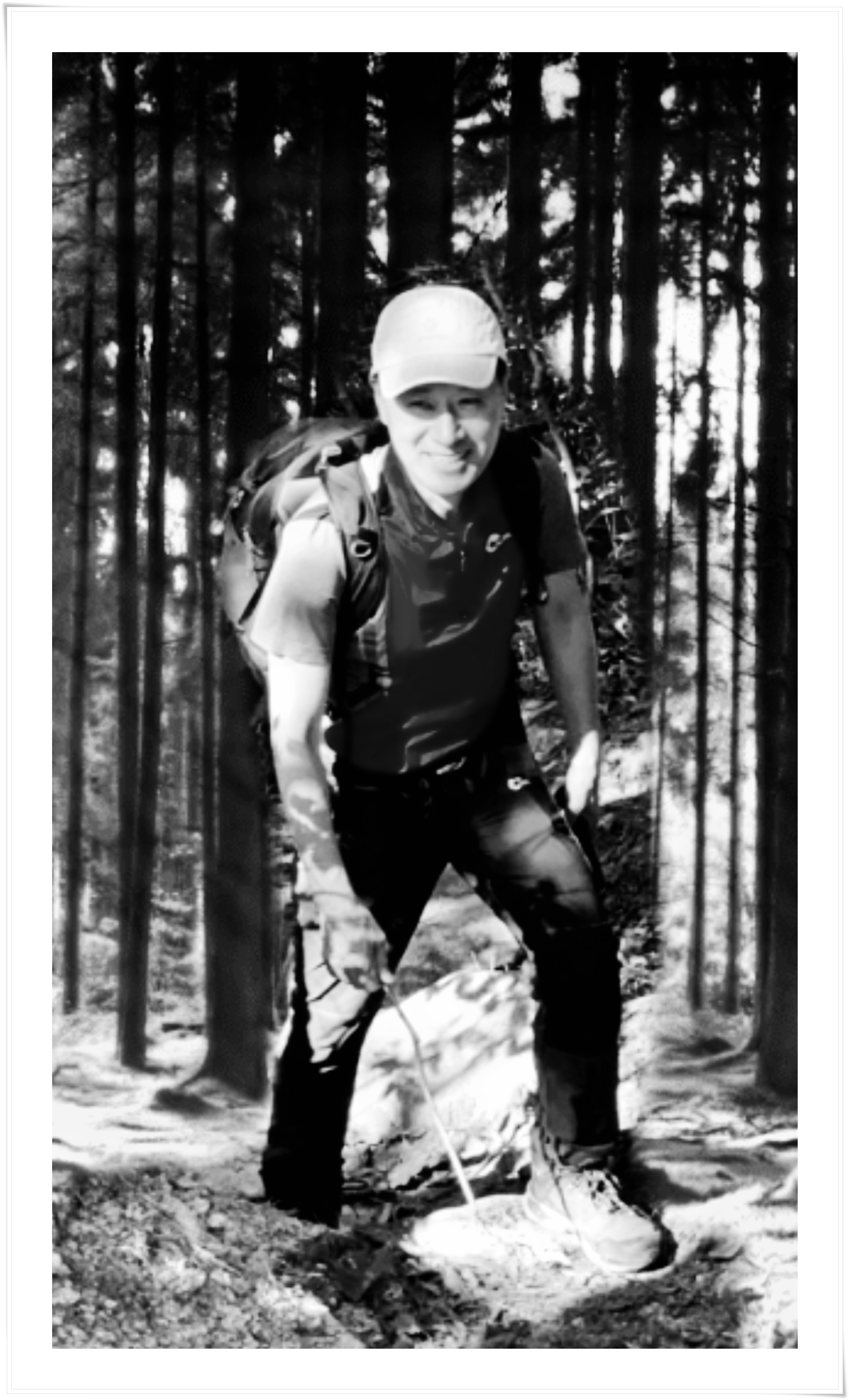목록한문고전 (200)
산이 좋은 날
 나옹화상의 선시
나옹화상의 선시
靑山兮要我以無語[청산혜요아이무어] 蒼空兮要我以無垢[창공혜요아이무구] 聊無怒而無惜兮 [료무노이무석혜]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靑山見我 無言以生 (청산견아 무언이생) 蒼空見我 無塵以生 (창공견아 무진이생) 解脫嗔怒 解脫貪慾 (해탈진노 해탈탐욕) 如山如水 生涯以去 (여산여수 생애이거)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 냄도 벗어 놓고 탐욕도 벗어 놓고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겨울밤
겨울밤
冬夜 겨울밤 淸나라때 사람 黃景仁(황경인) 空堂夜深冷 공당야심냉 텅 빈 집 밤되니 더욱 썰렁하여, 欲掃庭中霜 욕소정중상 뜰에 내린 서리나 쓸어보려다가, 掃霜難掃月 소상난소월 서리는 쓸겠는데 달빛 쓸어내기 어려워, 留取伴明光 유취반명광 그대로 달빛과 어우러지게 남겨두었네
 등소양정
등소양정
登昭陽亭(등소양정) -金時習(김시습) 소양정에 올라서 鳥外天將盡(조외천장진) 새는 하늘 밖으로 날아서 가고 愁邊恨不休(수변한불휴) 시름결에 한恨은 그치지 않네 山多從北轉(산다종북전) 산은 많아서 북쪽을 좇아 돌고 江自向西流(강자향서류) 강은 절로 서쪽을 향해 흐른다 雁下沙汀遠(안하사정원) 기러기 날아 내리는 모래톱은 아득하고 舟回古岸幽(주회고안유) 배 돌리는 옛 언덕 그윽한데 何時抛世網(하시포세망) 언제나 세상 그물 던져 버리고 乘興此重遊(승흥차중유) 흥에 겨워 여기 와서 다시 놀아볼까
畵梅花[화매화] 梅月堂 金時習[매월당 김시습] 그림속 매화 香魂玉骨先春姸[향혼옥골선춘연] : 향기로운 넋 옥골은 봄에 앞서 우아하고 獨占孤山煙雨邊[독점고산연우변] : 홀로 외로운 산의 비 오는 두메 차지했구나. 疏影暗香雖不動[소영암향수불동] : 성긴 그림자 은은한 향 움직이지 않아도 淸姝風韻正依然[청주풍운정의연] : 맑고 아름다운 기질과 정취 정말 의연하구나.
 勸君今夜須沈醉 樽前莫話明朝事
勸君今夜須沈醉 樽前莫話明朝事
근심이 일상이 되어버린 내게 술이 그리 친근하지 않지만 술에 관한 글귀를 읽다보면 친하고 안친하고와는 상관없이 근심이 사라질 것 만 같은 생각은 든다. 今朝有酒今朝醉 하고 明日愁來明日愁라. 오늘 아침 술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취하고, 내일 근심이 오거든 내일 근심을 하도록 하자. 권심權審 「자견自遣」의 끝 두 구절 勸君今夜須沈醉 樽前莫話明朝事 술잔 앞에 두고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인생사 어느 곳이 술잔 앞만 하랴 -구양수 선생 시구-
 雪中訪友人不遇 李奎報
雪中訪友人不遇 李奎報
모처럼 친구 집에 들렸는데 친구는 집에 없고 아무도 밟지 않은 집앞 눈이 종이보다 하얘서 그 눈위에다 말 채찍을 들어 다녀갔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면서 혹시 바람이 불어 다녀간 흔적을 지워 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을 쓴 글이다. 어릴적 친구들 집에 놀러갔다가 허전하게 발길을 돌리던 때가 생각나는 시다. 雪中訪友人不遇 李奎報 눈 위에 쓴 글씨(편지) 이규보 雪色白於紙(설색백어지)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 길래 擧鞭書姓字(거편서성자)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莫敎風掃地(막교풍소지)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好待主人至(호대주인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려무나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호가 백운거사(白雲居士)이다. 고려조 최고의 명문장가로 그가 지은 시풍은 자유분방하고 웅장한 것이 특징..
 채근담(菜根譚) 전집 82장 사거심공(事去心空)
채근담(菜根譚) 전집 82장 사거심공(事去心空)
菜根譚 전집 82장 事去心空 風來疏竹 風過而竹不留聲 雁度寒潭 雁去而潭不留影 故君子 事來而心始現 事去而心隨空 바람이 성긴 대나무 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 숲은 소리를 남겨 두지 않고 기러기가 아름다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오면 비로소 마음도 나타나고 일이 지나가면 마음도 따라 공으로 돌아간다. 대나무 숲이 소리를 잡아두려하지 않고, 연못이 기러기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잡아두려하지 않듯, 사람도 부귀나 공명이 찾아오면 도리를 지키어 맞아들이고 그것이 가버리면 집착하지 않고 깨끗이 보내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상촌선생시 生事二間屋(생사이간옥)
상촌선생시 生事二間屋(생사이간옥)
글씨를 쓰다보니 잘 쓰지는 못하면서 습관처럼 붓을 잡게 되고 이런저런 한시들을 둘러보게 되었다. 옛 사람들의 표현력이 정말 아름답고 섬세해서 놀랍다. 바람자리 이슬꽃은 담백하고 소박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해서는 잘 쓰지 못하면서도 한글자 한글자 마음에 새기면서 써봤다. 象村 申欽先生詩 生事二間屋(생사이간옥) 幽襟萬古情(유금만고정) 披衣步蘿逕(피의보라경) 倚杖聽溪聲(기장청계성) 風散露華澹(풍산로화담) 林深靈藾淸(임심영뢰청) 宵分仍坐久(소분잉좌구) 凉月上江城(량월상강성) 살림살이 두칸짜리 집에서 아득한 만고의 정을 느끼다 옷 걸치고 나가 넝쿨진 오솔길을 걸어 지팡이 짚고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 바람 흩어 지난자리에 이슬 꽃은 소박하고 깊은 숲의 그윽한 소리 맑기도 하다 한 밤중 오래도록 앉아 있는데 서늘..